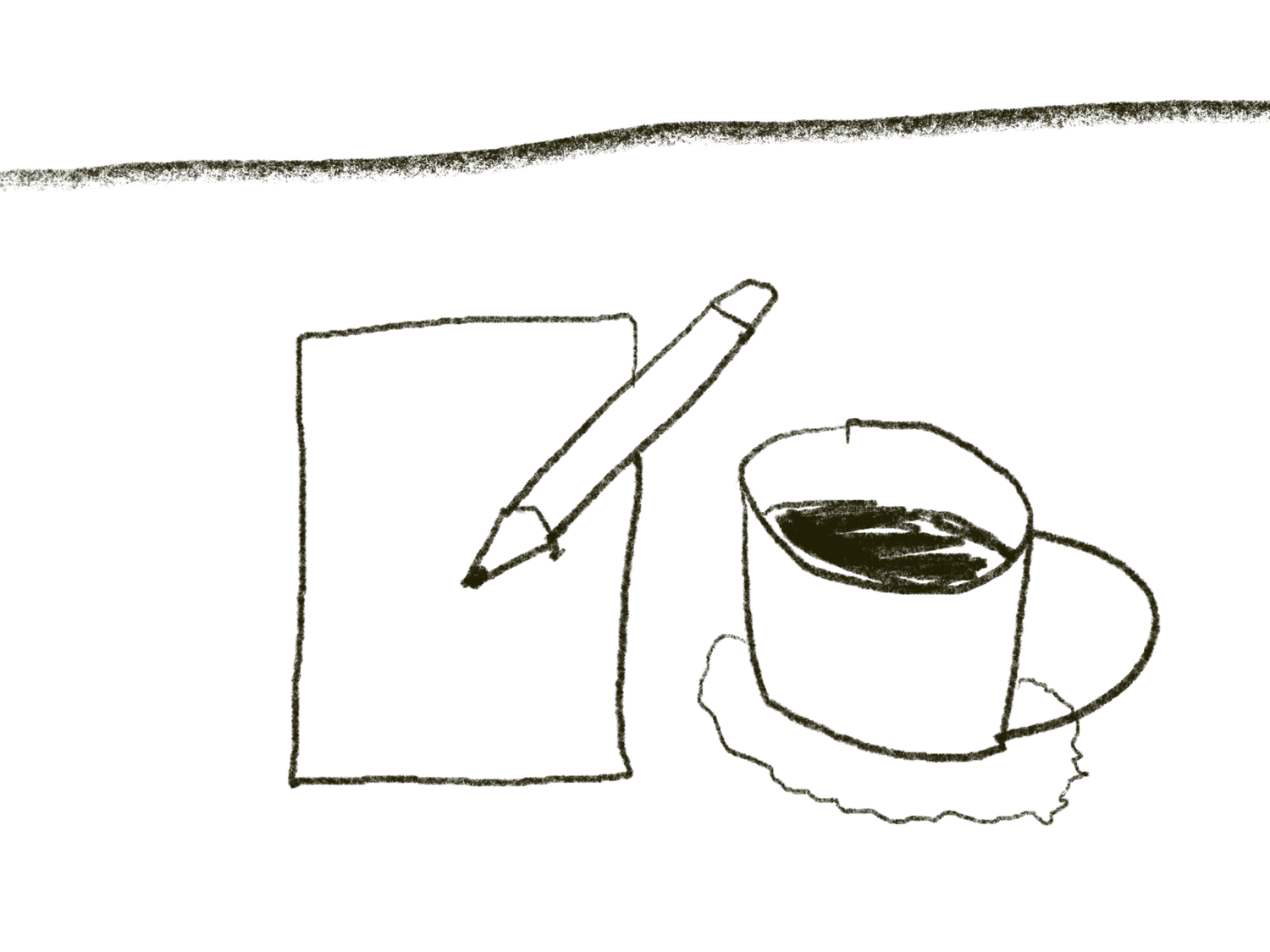목표: 니트 입기
“집에 예쁘고 따뜻한 옷도 있는데 맨날 저지 소재의 맨투맨이나 후드 같은 것만 입네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 이 주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상담받고 돌아가는 길, 사게 되는 옷과 실제로 입고 다니는 옷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는 몇 년 전으로, 겨울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옷장에 톡톡한 니트가 많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니트를 입기가 힘들었다. '조금 엄살을 피우는 거 아닐까' 혹은 '모두가 그렇지 않나?'라고 합리화하느라, 니트를 입지 못하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 불편함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대체 니트를 입으면 어떤데, 하는 질문엔 답하기 어렵지 않았다. 몸에 닿는 느낌이 무척 불쾌하고, 자꾸만 소름이 돋았다.
20대 초중반까지 자주 입었던 코트는 세탁비닐까지 그대로 박제되어 본가 옷장에 나란히 걸려있었다. 영하 2~30도의 날씨에서도 몇 킬로를 걸어서 통학했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는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스스로 의아해졌다. 영하 40도가 아니라 영하 4도만 되어도 이가 달달 부딪히는 추위로 느껴져서였다. 한겨울에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나온 친구를 보면, 그 친구가 얼마나 추울지를 상상하고 오지랖 넓게 걱정하느라 정신이 빼앗겼다.
“아니, 이 날씨에 어떻게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죠?”
“그 사람이 지언씨와 비슷하게 춥게 느낄 것 같나요?”
“네. 너무 춥잖아요. 날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고통스럽다면 그렇게 입을 수 없겠죠. 안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 사람이 제가 느끼는 이 추위를 견디면서 입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다. 애초에 이렇게 춥지도, 그 짧은 치마에 얇은 스타킹이 최소한 나만큼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입겠다고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을 터였다. 이제껏 내가 예쁜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쁜 옷을 입을 수 없었던 거였다니. 심리 작업의 목표는 새삼스럽게도 ‘편안하게 예쁜 옷 입기'가 되었다.
*
가끔 본가에 들러 반가운 마음으로 마주한 엄마는 내가 입는 옷에 대한 코멘트로 첫인사를 대신하곤 했다.
“아이고, 왜 옷을 또 거지 같이 입었어!”
“엥? 하하. 뭐 그런 말을 해!”
가끔 엄마가 던진 말에 화보다도 실소가 먼저 터져 나왔다. 김'직언'이라는 별명의 소유자로서, 이 직언 DNA는 모전여전이었구나 했다. 이때 ‘거지 같이’는 ‘거지같다'할 때의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거지' 같다는 의미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엄마는 나에게 자신이 입던 옷을 입기를 종용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디서(주로 홈쇼핑이나 신평화시장에서) 산 옷이라며 이번에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 나는 굳이 더 듣지 않아도 엄마가 무슨 옷을 건넬지 알았다. 니트였다. 엄마는 톡톡한 니트를 좋아했으니까. 엄마 본인이 니트 컬렉터다 보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도 니트를 입혔다. 회색 니트, 노란색 니트, 꽃 모양 단추가 달린 니트 카디건, 앙고라 털로 짜인 가려운 니트, 까슬까슬한 울 니트, 니트라면 무엇이든 옳았다. 돌이켜보면 엄마에게 니트는 걱정 섞인 사랑이 아니었을까. 어디서도 춥지 않길 바라는 마음 말이다.
그런 엄마의 마음과는 별개로, 내가 기억하는 한 난 늘 니트가 싫었다. 엄마와 달리 어린 시절 나는 늘 통통했고, 몸에 열이 많아 두꺼운 니트가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니트를 입으면 자꾸만 근질거렸다. 니트는 저지 같은 소재의 옷보다 몸매가 드러났고, 니트를 입은 내 몸이 별로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통통한 몸에 껴입은 니트 사이로 땀이 맺힐 때, 니트 입은 나를 거울로 볼 때 몸에 대한 수치심이 뿌리를 내렸다. 니트를 입을 때면 온몸을 벅벅 긁고 있는, 통통한 아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엄마가 내게 주는 사랑을 받는 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기도 어려웠던 그때로.
*
근 몇 년 동안 나는 예쁘고 싶지 않았다. 날 꾸며주고 싶은 마음이 좀처럼 들지 않았다. 거기까지 힘을 뻗칠 에너지가 없었나, 거기에 쓸 돈이 없었나, 내가 나를 예뻐해 주기 어려웠나, 하면 셋 다였다. 우연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끔 옷을 구입하기는 했지만, 사면서도 내심 불필요한 소비로 느껴지곤 했다. 매장에 들어갔는데 아무 것도 안 사고 나오기가 애매한 분위기여서 사기도 하고, 시기심과 죄책감으로 옷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런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 전 나를 위해 흔쾌히 옷을 산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다. 마음에 딱 드는 옷을 나에게 사주고 싶어서 옷을 샀다. 대단한 옷은 아니었다. 근사한 자리에 입고 나가야 할 것 같은 옷, 잘 보이기 위해 입을만한 옷이 아니라, 매일 부담 없이 동네 산책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 가볍고, 피부에 닿는 촉감이 아기 옷처럼 좋고, 알록달록한 옷을 좋아한다는 것을, 또 그런 옷을 고르는데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입었을 때 나보다 더 나아져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들지 않는 옷이 좋고, 편하기만 하고 나 자신이 추레하게 느껴지지 않는 옷이 좋다.
산책 메이트 자네와 뒷산에 오르기 위해 빨간 바지에 노란 후드티를 입었다. 패션 아이템 중 신발을 가장 좋아하지만, 심각한 평발임을 알기에 예쁜 신발은 조금 포기하기로 했다. 내 골반과 척추의 바른 정렬은 너무 소중하니까 말이다. 늘 신는 튼튼한 운동화에 딱 나만큼의 부피로 감싸지는 옷을 입고 나서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적당히 타협한 옷차림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뒷산 개나리가 만개한 곳에서 곱게 사진도 남겼다.
이제 따뜻한 봄날에도 편안하게 니트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여전히 새삼스럽다. 원래의 목표가 편안하게 예쁜 옷(특히 니트) 입기였다면, 이제 목표를 조금 수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예쁘게 편안한 옷 입기로. 그 편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니까.
쓴 사람 | 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