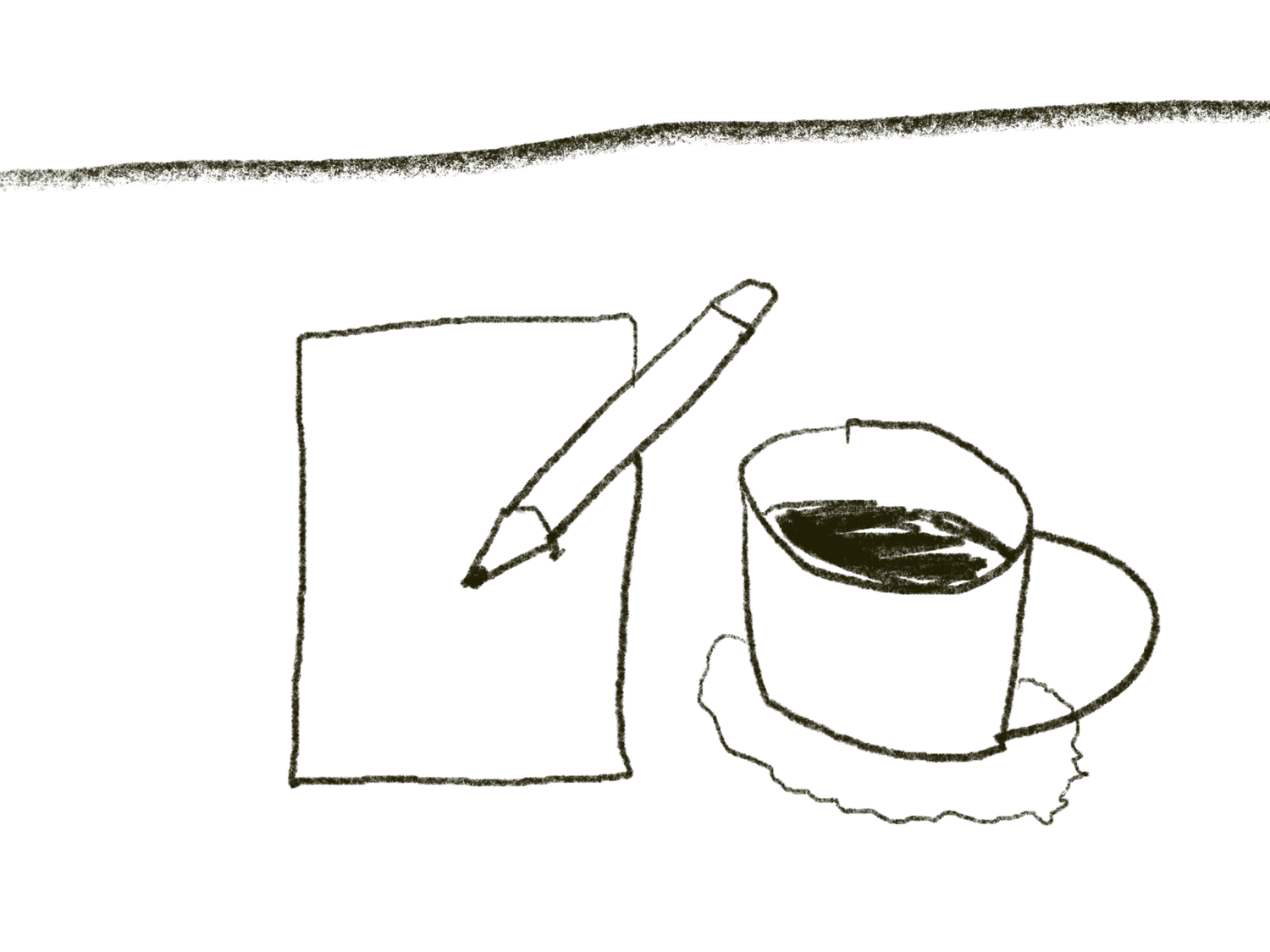나무를 깎는 시간
2박 3일간 평창의 외딴 시골 숙소에서 고요히 쉬어가는 시간을 보냈다.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이화에 월백하고'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머무르는 내내 하루에 한 번 카페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었다. 책 읽기를 잠시 쉬어갈 때마다 여덟 명 남짓 머무를 수 있는 아담한 내부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숫자가 쓰여있는 나무 블록으로 만든 달력, 연필꽂이, 모빌, 도마와 도마 꽂이 등 사장님만의 고유한 미적 감각이 느껴지는 물건들이 눈에 띄었다. 사장님께서는 나무를 깎아 물건을 만드는 법을 배워본 적은 없으시고,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오랜 세월 만들어왔다고 하셨다.
나무를 깎아 만든 물건의 아름다움을 잔뜩 느꼈던지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우드 카빙에 대한 마음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런 마음을 품은 채로 강릉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던 목공방에서 우드 카빙 워크숍을 한다는 인스타그램 글이 올라왔다. 하고 싶은 마음과 적절한 기회가 잘 맞아떨어진 순간이었기에 나와 짝꿍은 아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워크숍을 신청했다.
며칠 뒤 목공방이 있는 속초로 향했다. 속초는 강릉과 가까워서 여러 번 가보기는 했지만, 공방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딴 동네에 있었다. 날이 흐리고 해가 질 무렵의 시간이라 거리의 분위기는 다소 어두웠지만, 공방은 두세 개의 주백색 스탠드 불빛 덕분인지 따뜻하고 아늑하게만 느껴졌다.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한 켠은 공방으로, 다른 한 켠은 직접 만드신 가구들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공간 전체에 향긋한 나무 내음이 가득했다. 따뜻한 색감의 스탠드 조명과 낮은 조도, 진득한 나무 내음, 그리고 목수님의 느긋한 접객 덕분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워크숍을 시작할 수 있었다.
워크숍의 시작은 우드 카빙의 도구인 끌을 익히는 것이다. 끌을 처음 써보았기에 연습용 나무를 깎아보며 도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목수님께서 도구를 어떻게 쥐고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는 알려주셨지만,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하는지는 온전히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일이었다. 힘을 세게 주면 너무 깊게 파이고, 그렇다고 힘을 약하게 주면 잘 깎이지 않는 탓에 적절한 힘을 주는 게 중요한데, 역시나 적당히가 어렵다는 걸 새삼 느꼈다. 우리는 끌이 손에 익을 때까지, 원하는 깊이와 너비만큼 일정하게 파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했다.
일정한 크기로 깎아내기 위해 마음을 모으다 보니 들쭉날쭉했던 모양새들이 제법 일정해졌다. 처음이다 보니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에 ‘이만하면 충분하다'싶은 선에서 만족했다. 목수님께서도 ‘이제는 실전으로 넘어가도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기지개를 크게 한 번 펴고서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짝꿍은 동그란 모양의 컵 받침대에 초승달을 그려 넣었고, 나는 네모난 모양의 컵 받침대에 벌집 패턴으로 깎아보기로 했다. 일정하게 잘 깎아보고 싶은 마음에 연필과 자로 첫 줄이 시작되는 지점을 일직선으로 그었다. 그러고는 끌을 들어 숨을 크게 내쉬고는 하나씩 천천히 파내기 시작했다. 세로로 길쭉한 육각형 모양의 벌집 구멍 하나를 깎아내기 위해서 두세 번의 끌질을 해야 했는데, 육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손으로 톱밥을 털어내고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서는 원하는 깊이와 길이만큼 깎였는지 확인했다.
한 줄에 열네 개의 육각형이 있었고, 그렇게 총 열두 줄을 깎아내야 했다. 두 줄을 깎아낼 때마다 다소 참아왔던 숨을 푹 내쉬며 긴장되어 있던 팔과 어깨, 그리고 목을 한껏 풀어줬다. 나무를 처음 깎으면서 가장 어렵게 느낀 건 팔에 힘을 빼는 일이었다. 손과 팔은 끌의 위치와 방향을 잡아주고, 몸에 힘을 주어 나무를 깎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팔에만 힘이 들어가서 팔과 어깨가 금세 경직되기 일쑤였다. 처음 연습할 때는 ‘팔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줘야지'라고 스스로 되뇌었는데, 어느새 팔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처음이니까 힘이 좀 들어가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다음 날 팔과 어깨에 피로가 쌓이는 것도 경험이고,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레 팔에 힘을 빼고 나무를 깎는 요령을 터득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깎아내는 작업을 모두 마치고는 나무가 물에 닿아도 썩지 않도록 오일을 발라줬다. 오일을 나무에 도포하여 검지로 꼼꼼하게 펴 발랐다. 미끄러운 오일을 거친 나무에 입혀줄 때, 어린아이가 촉감놀이를 하는 게 이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했다. 다 완성을 하고 나니 매끈해진 나무의 느낌이 좋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요리조리 각도를 바꿔가며 음영에 따라 달라지는 깊이감을 음미하기도 했다.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볼펜과 카메라에 익숙해진 손이었는데, 끌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써보니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게 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작은 물건들은 직접 만들어서 써도 좋겠구나!’ 어떠한 물건이든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만드는 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만드는 일에 더 힘쓰는 분위기가 되면 물건은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우드 카빙 워크숍을 마치고 며칠 뒤 애정 하는 책 <핸드메이드 라이프>를 다시 읽었다. 다이소에서 천 원이면 같은 용도의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두 시간이 넘도록 애쓰며 깎은 물건이라 그런지 컵 받침대를 쓸 때마다 흐뭇한 마음이 피어오르며 괜히 한 번 더 만지작거리게 된다. 오랜만에 직접 만든 물건을 써보니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 쉬워질수록 물건에 대한 애정도 덜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종종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쓰며 소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자고 다짐하게 된다.
☀︎ 퐈이어빈
강릉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지만,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마실 버스를 타고 찾아간다. 바닐라 라떼가 없는 아쉬움은 홍천산 헤이즐넛 라떼로 잊혀진다.
쓴 사람 | 현우